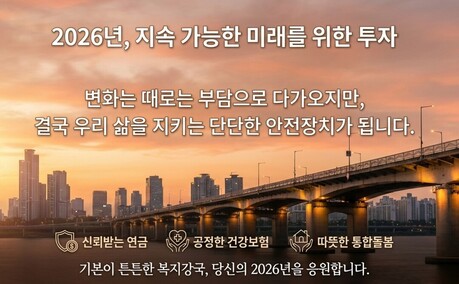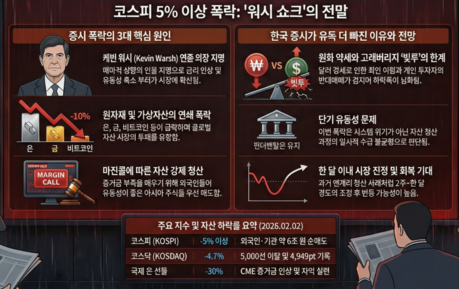"양적 성장의 한계, 이제는 '브랜드의 결'이 승부처"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허양 기자]
국내 커피 전문점이 10만 개를 돌파하며 완전한 포화상태에 진입했다. 편의점보다 많은 커피숍이 거리 곳곳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살아남는 브랜드들의 차별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커피시장은 단순한 '맛' 경쟁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과 고객경험을 중심으로 한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홈카페 급부상, 4000억 캡슐커피 시장 견인
특히 홈카페 트렌드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위협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고물가 장기화와 함께 소비자들이 '짠물소비' 성향을 보이면서 아예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홈카페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 외부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구매할 경우 월 15~20만원이 지출되지만, 캡슐커피로 대체하면 이 비용을 10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은 2018년 1000억원에서 2023년 약 4000억원으로 4배 성장했다. 네스프레소를 비롯해 다이소, 할리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폴바셋까지 대부분 커피 브랜드가 캡슐커피 시장에 뛰어들며 제품의 맛과 품질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다이소가 개당 300~500원의 초가성비 캡슐커피를 출시하며 가격 경쟁을 촉발한 것도 홈카페 확산에 기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착된 홈카페 문화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외부 커피 매장 이용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회용품 규제, 텀블러 사용 장려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소비자 부담감도 홈카페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두값 급등이 부른 '대체커피' 열풍
국제 원두 가격이 파운드당 400센트를 넘어 197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생두 수입가가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 원두 가격 급등은 의외의 시장을 키웠다. 바로 커피가 아닌 버섯, 보리, 허브 등으로 커피 향과 맛을 구현하는 '대체커피' 시장이다. 대체커피는 원두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칼슘 손실과 카페인 과잉 반응 등 기존 커피의 단점을 해결하면서도 맛과 향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리미엄 vs 가성비, 확연한 포지셔닝 경쟁
이런 홈카페 위협 속에서도 고급화 전략의 선봉에 선 폴바셋과 블루보틀은 세계 바리스타 챔피언의 명성과 섬세한 추출과정을 앞세워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확고히 했다. 특히 폴바셋은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며 오피스 상권을 집중 공략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반면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 빽다방 등 저가 브랜드들은 '짠물소비'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냈다. 저렴한 가격에도 높은 품질을 유지하며 손흥민(메가MGC), BTS 뷔(컴포즈), 지드래곤(더벤티) 등 톱스타를 앞세운 팬덤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 고도화에 나섰다.
틈새시장 공략하는 전문가들
전문성을 무기로 한 브랜드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국내 최초 커피 브루잉 시장을 개척한 파이브브루잉은 블로그와 세미나, 저서를 통해 전문성을 알렸고, 본아이에프의 이지브루잉커피는 바리스타 없이도 챔피언급 레시피를 구현하는 '이지바리스타' 자동추출 시스템으로 차별화했다.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는 로스팅 교육과 원두 납품 사업으로 B2B 영역까지 확장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높였다.
메뉴 혁신과 현지화 경쟁 가속
메뉴 다변화 경쟁도 치열하다. 메가MGC커피의 컵빙수와 수박주스는 계절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 사례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로컬라이제이션(현지화) 전략이 주목받는다. 빽다방의 제주 감귤에이드와 강원도 옥수수라떼, 스타벅스의 인절미·단호박 한정메뉴는 지역 특색을 살린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다.
대체커피 시장 진출도 새로운 트렌드다. 원두 가격 인상과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버섯, 보리, 허브를 활용한 대체커피가 각광받고 있다. 동서식품 카누의 캡슐커피 진출과 다이소의 초가성비 캡슐커피는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매장 경험과 운영 효율성이 핵심
고객 경험 최적화도 생존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해리포터 테마카페나 대형 창고형 카페처럼 독특한 공간 디자인은 단순한 음료 구매공간을 넘어 체험공간으로 진화시켰다. 팀홀튼은 따뜻한 목재 톤과 단풍잎을 활용한 '메이플 감성'으로 캐나다 정체성을 전달하며, 도넛과 커피를 결합한 복합메뉴로 젊은층을 사로잡았다. 운영 효율성 개선도 필수가 됐다. 가맹점들은 출퇴근 시간대 2인 운영, 그 외 시간 1인 근무체제와 POS 자동화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 타이거커피는 스타벅스보다 30분 일찍 여는 '근면함'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해외진출과 ESG 경영으로 돌파구
치열한 국내 경쟁을 피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브랜드도 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몽골 1호점을 시작으로 매장을 확산하고 있고, 빽다방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도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됐다. 스타벅스는 종이빨대 도입과 생분해 포장재 사용, 개인 텀블러 할인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의 '결' 설계가 생존 열쇠"
업계 관계자는 "홈카페 확산과 대체커피 시장 성장 등 새로운 위협요소가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차별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순한 맛 경쟁을 넘어 브랜드만의 고유한 '결'을 설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혁신적인 마케팅과 고객경험 전략을 펼치는 곳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저가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점주와의 상생에 초점을 맞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양적 팽창의 한계를 인식하고 브랜드 본질에 충실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