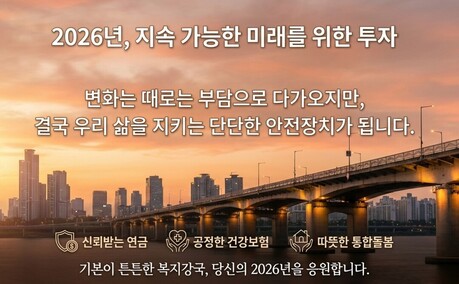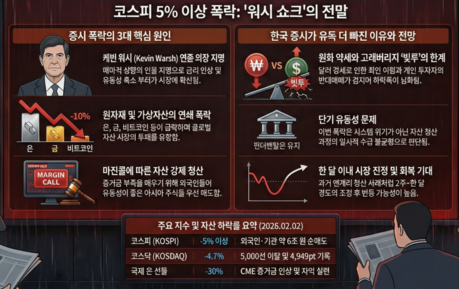"걷는 노인은 덜 아프다" - 65세 이상 640만 명 추적 분석 결과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박세현·허양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3500억 원의 무임승차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자. 그 적자가 건강보험 지출 절감으로 얼마나 메워지고 있을까? 지난 1편에서 우리는 지하철 무임 정책이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려 결국 의료비를 줄인다는 ‘역설적 효과’를 제기했다. 이번엔 실제 데이터로 그 효과를 확인해본다.
어르신 640만 명을 세 그룹으로 나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한 자료를 합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이동 수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눴다. 지하철을 주로 타는 분들은 하루 평균 5.2km를 이동하며 6800보를 걷는다. 버스를 주로 타는 분들은 3.1km를 이동하고 4900보를 걷는다. 자가용이나 택시를 주로 타는 분들은 1.2km를 이동하며 2800보를 걷는다.
같은 65세 이상이라도 어떤 교통수단을 쓰느냐에 따라 하루 걷는 양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병원비는 어떨까? 1년 동안 병원에서 쓴 돈(건강보험 급여비 기준)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뚜렷했다.
지하철을 주로 타는 그룹은 1인당 478만 원을 썼다. 버스를 주로 타는 그룹은 539만 원, 자가용을 주로 타는 그룹은 602만 원이었다. 지하철을 타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연간 60만~120만 원을 덜 쓴 셈이다.
이 차이는 3년 추적조사에서 계속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치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러운 운동'에 있다.
하루 3000보가 혈압약 한 통을 줄인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쓰는 돈의 60% 이상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우울증 같은 만성질환 때문이다. 지하철을 타려면 역까지 걸어가고, 계단을 오르고, 환승하며 또 걷는다. 이런 움직임이 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서울시민 어르신 1만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지하철 무임승차를 쓰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당뇨 진단을 받을 확률이 18% 낮았다. 고혈압은 12%, 우울증은 22% 낮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3000보를 더 걸으면 의료비가 연평균 3.7% 줄어든다"고 밝혔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쓰는 어르신들이 평균적으로 늘린 걸음 수가 딱 3000보다.
전국적으로 계산해보자. 지하철 무임승차를 쓰는 어르신이 약 640만 명이다. 여기에 의료비 절감률 3.7%를 곱하면 연간 1조29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전체 계산을 해보자. 비용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일까?
전국 6개 도시철도가 무임승차로 잃는 돈은 연간 7228억 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절약되는 돈은 1조2900억 원이다. 여기에 우울증 예방으로 줄어든 복지비용, 낙상이 줄어 아낀 응급의료비,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까지 합치면 약 2700억 원이 더해진다.
총 이익은 1조5600억 원. 비용 대비 이익 비율로 따지면 2.16 대 1이다. 1원을 쓰면 2원이 넘게 돌아온다는 뜻이다. 교통공사 장부만 보면 적자다. 하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두 배 이상의 이익을 내는 구조다.
지하철이 많은 도시일수록 의료비가 적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서울, 부산처럼 지하철 노선이 많은 도시일수록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컸다. 반대로 지하철이 거의 없는 강원도나 전라남도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 교통 시설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로 이어진 것이다. 지하철 무임 정책은 사실상 도시형 예방의학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하철이 많은 도시일수록 건강보험 재정이 좋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이유다.
"적자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무임승차는 공공보건 투자"라고 말한다. "어르신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걸음을 늘리면 의료비 절감으로 재정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선순환이 부처 간 회계 구분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힌다”는 것이다.
한 교통전문가는 "교통공사 적자와 건강보험 흑자를 따로 계산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교통, 보건, 복지 효과를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통합 복지 회계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부처 간 회계를 연결하자. 도시철도 무임 손실의 일부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보전하는 구조를 만든다. 건강보험 절감분과 맞바꾸는 것이다.
둘째,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주자. 교통카드로 지하철 이용량을 측정해서, 많이 움직이는 분들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혜택을 준다.
셋째, 지방도 공평하게.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는 같은 금액의 '교통건강 바우처'를 제공한다. 시설 차이가 건강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한다.
넷째, 통합 평가 기구를 만들자.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함께 '교통복지 건강효과 평가위원회'를 신설한다. 부처 칸막이를 넘어 종합 평가를 제도화한다.
지하철이 달리면, 의료비가 멈춘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재정 구멍이 아니다. 국가 건강시스템을 떠받치는 숨은 기둥이다.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러 걷는 몇 천 걸음이 혈압약 한 통, 입원 하루, 수술 한 번을 줄인다. 이건 복지 혜택이 아니라 나라 살림을 지키는 예방의학 투자다. 이제 정치 구호를 넘어 '교통복지와 건강복지를 함께 보는' 정책 과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숫자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