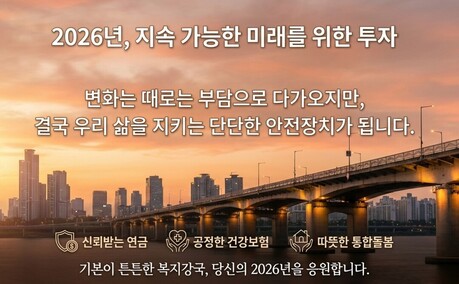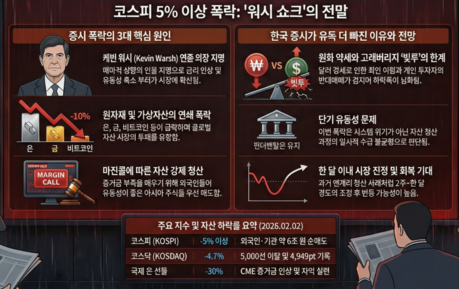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모델 찾아야

[프랜사이트 = 특별취재팀 박세현·허양 기자]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24시간 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도, 영국도, 프랑스도 이 정도로 포괄적인 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40년 동안 유지돼 온 이 제도는 한국 사회의 '효도 복지'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본격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이 이미 겪은 '복지 재설계'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 주요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일본, 영국, 프랑스의 교통복지 개혁 사례에서 한국형 지속가능 모델의 실마리를 찾아봤다.
일본: 소득별 차등 부담으로 형평성 확보
일본 도쿄도의 '실버패스'는 만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버스, 노면전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제공한다. 하지만 완전 무료가 아니다. 소득에 따라 연간 1,000엔에서 2만510엔(약 9000원~1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저소득층(연 소득 158만 엔 이하)은 1000엔만 내면 1년 내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산층은 1만엔, 고소득층은 2만510엔을 낸다. 도쿄도는 이 제도로 2024년 기준 연간 약 420억 엔(약 3800억 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일본은 무임 대신 '저가 정액제'를 택함으로써 혜택의 지속성과 세대 간 수용성을 동시에 잡았다. 도쿄도청 관계자는 "실버패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티켓"이라며 "약간의 비용 부담이 제도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영국: 오전 9시 30분 이후 무료... 만족도 83%
영국의 '프리덤 패스(Freedom Pass)'는 국가연금 수급 연령 이상(현재 66세) 노인에게 런던 지역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단, 평일 오전 9시 30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에 일반 승객과 경쟁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뤘다. 시간 제한 도입 후(2009년) 런던교통공사(LTfL) 적자가 12% 줄었다. 이용자 만족도는 83%, 제도 유지 찬성률은 89%에 달한다.
런던시 교통정책 자문관 샬럿 휴스턴은 "우리는 복지의 크기를 줄이지 않았다"며 "다만 '언제'와 '어떻게'를 설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한은 불편이 아니라 복지를 지탱하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선별 복지로 효율성 극대화
프랑스의 '나비고 연대 교통권'은 만 65세 이상 중 월소득 2200유로(약 32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만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버스·지하철 무료 이용권을 준다. 나머지 고령층은 50% 할인을 받는다.
파리시 분석 결과 제도 시행 후 5년간 교통예산 지출이 14% 감소했다. 반면 저소득 고령자의 이동량은 22% 증가했고 건강지표도 개선됐다.
프랑스 교통부 고령사회국장 에멜린 뒤퐁은 "모든 노인에게 공짜를 줄 수는 없다"며 "움직여야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세 나라의 사례는 한국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보편'에서 '조정된 보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과 영국처럼 연령, 시간, 소득에 따른 합리적 제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 이는 복지 축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설계'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지하철 중심'에서 '통합 이동권'으로 확대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지하철, 버스, 택시, 지방교통을 아우르는 통합 교통복지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버스 지원은 지자체별로 파편화돼 지역 간 복지 격차가 크다.
셋째, '복지회계'에서 '건강경제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복지는 단순한 운송비 지원이 아니라 국가의 건강 투자다. 노인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 효과를 재정 회계에 반영해야 제도의 진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세 나라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형 교통복지 시스템'을 복지의 보편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 제안한다.
연령 기준 조정: 2026년 67세로 상향한 뒤 2030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재정을 절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다.
시간 제한 도입: 영국처럼 출퇴근 시간을 제외해 혼잡을 완화하고 공정성을 강화한다.
소득 기준 적용: 프랑스처럼 저소득층은 무료, 중산층은 할인을 적용해 형평성을 개선한다.
본인 부담 도입: 일본처럼 연간 1만~2만 원 정도의 소액 부담으로 제도 지속성을 확보한다.
건강 연동 인센티브: 일정 이동량 이상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예방의학 효과를 강화한다.
"복지를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은 설계하는 것"
한국의 65세 이상 무임승차 제도는 단순히 지하철표가 아니라 사회적 이동성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존재하려면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교한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본의 실버패스가 보여준 자율적 부담, 영국의 시간제 복지가 구현한 공정한 이용, 프랑스의 선별형 지원이 증명한 효율성. 이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갈 길이다.
복지는 나눔이 아니라 설계다. 설계 없는 나눔은 오래가지 못한다.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대한민국, 이제 복지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시혜가 아닌 시스템으로 완성돼야 한다.
[저작권자ⓒ 프랜사이트 (Fra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